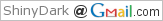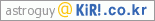나도 지르고 싶다...
'Free'에 해당되는 글 440건
- 2005.01.23 나도.. 한번 질러볼까? 1
- 2005.01.22 (저작권법 개정 후)제가 좋아하는 노래 가사에요~ 2
- 2005.01.22 랩에 관한 단상
- 2004.12.26 장갑 이야기 1
- 2004.11.28 흐흣 blog에 대한 가치판단의 변화
- 2004.11.11 아마추어 랩퍼 소개 - 안태근 : 철없는 개발자의 넋두리
- 2004.11.04 근황 2
- 2004.10.29 새로운 음악적 키워드 "중독성"
XXX XX XXX XX XXXXX XXXXX X XX
X XXX XX XXXX
XXXXX XX XX XXXXX XX XX
XX XX X X XX XXXX XXX X X XXX
X XX XXX XX X XX X X X XXX XX
XX XXXX XX X XX XX XX XXXX XXXX
XXX XXX XX XX XXX,
XXX XXXXX XXX X X?
X XXX XX XXXX XXX,
XXXX XX X XXX XXX?
XXX XX XXX XX,
XXX XXX X XXX XX XX X
X XXXX XX XX XXX XX XX XX
XX)
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
XX XXXXXXXXXXXXXXXXXXX XXXXXXX
새로 강화된 저작권법 걱정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마음껏 올려보세요~
X XXX XX XXXX
XXXXX XX XX XXXXX XX XX
XX XX X X XX XXXX XXX X X XXX
X XX XXX XX X XX X X X XXX XX
XX XXXX XX X XX XX XX XXXX XXXX
XXX XXX XX XX XXX,
XXX XXXXX XXX X X?
X XXX XX XXXX XXX,
XXXX XX X XXX XXX?
XXX XX XXX XX,
XXX XXX X XXX XX XX X
X XXXX XX XX XXX XX XX XX
XX)
XXXXXXXXXXXXXXXXXXXXXXXXX?
XXXXXXXXXXXX XXXXXXXXXXX
XXXXXXXXXXXXXXXXXXXX XXX?
XX XXXXXXXXXXXXXXXXXXX XXXXXXX
새로 강화된 저작권법 걱정 마시고 저처럼 이렇게 좋아하는 노래 가사를 마음껏 올려보세요~
슬로우 힙합이라고 해야하나? 모르겠다 그런건. 음악적 장르를 구분하는 기준은 누구란 말인가?
어쨌든 난 그런걸 쓰기를(역시 쓴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만.. 표현한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동시에 좀 더 모호해진다는 역설을 지니고 있다) 매우 좋아했다. 잘하는지 어떤지는 알 바 아니고, 그저 그런 활동(어휘 선택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것은 안다. 모두 따지고 들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매우 짧으니 그냥 넘어가자)이 즐겁고 재밌는 취미의 한 부분이었다. 그 자체를 즐길 뿐.
어딘가에 적어두지 않아 금새 잊혀져버린 "오호, 이거 좋군(나의 기준과 판단에서)"하던것들도 무의 공간으로 빨려들어가 버리고(다시 FF5가 하고싶다...), 난잡한 내 스타일 답게 난잡한 주제로 떠들어 대던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내 기억 속을 유유히 부유하고 있다.
DO 3집 소나기(조PD 형님)를 들으면서 문득 느낀건 "음.. 역시 내가 원하는건 이런 스타일이야"라는 것이다. 동시에 또다시 "다시 한번 내 열정을 땡겨볼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 전문가는 될 수 없다. 원인이야 셀 수 없이 많지만, 첫째를 꼽으라면 어휘력. 둘째는 생각의 스타일(수많은 생각들이 늘 머릿속을 빠른 속도로 떠다니기 때문에 글로 적으려 하는 순간 다른 스타일일과 주제가 되어버린다. 다시 천천히 생각하려 해도 이미 내 기억을 떠나버리고 만다.).
하지만 어떤가. 그저 취미일 뿐인데. 나는 오늘도 머릿속에서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노래를 룰루랄라 노래부른다.
내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함께. 즐겨. 뭘하든. 너라도.
어쨌든 난 그런걸 쓰기를(역시 쓴다는 표현이 맞는지도 모르겠다만.. 표현한다고 하면 좀 더 정확하긴 하겠지만 그만큼 동시에 좀 더 모호해진다는 역설을 지니고 있다) 매우 좋아했다. 잘하는지 어떤지는 알 바 아니고, 그저 그런 활동(어휘 선택에 매우 문제가 많다는것은 안다. 모두 따지고 들기엔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 매우 짧으니 그냥 넘어가자)이 즐겁고 재밌는 취미의 한 부분이었다. 그 자체를 즐길 뿐.
어딘가에 적어두지 않아 금새 잊혀져버린 "오호, 이거 좋군(나의 기준과 판단에서)"하던것들도 무의 공간으로 빨려들어가 버리고(다시 FF5가 하고싶다...), 난잡한 내 스타일 답게 난잡한 주제로 떠들어 대던 것들은 정리되지 않은 채로 내 기억 속을 유유히 부유하고 있다.
DO 3집 소나기(조PD 형님)를 들으면서 문득 느낀건 "음.. 역시 내가 원하는건 이런 스타일이야"라는 것이다. 동시에 또다시 "다시 한번 내 열정을 땡겨볼까?"하는 생각도 들었다. 분명 전문가는 될 수 없다. 원인이야 셀 수 없이 많지만, 첫째를 꼽으라면 어휘력. 둘째는 생각의 스타일(수많은 생각들이 늘 머릿속을 빠른 속도로 떠다니기 때문에 글로 적으려 하는 순간 다른 스타일일과 주제가 되어버린다. 다시 천천히 생각하려 해도 이미 내 기억을 떠나버리고 만다.).
하지만 어떤가. 그저 취미일 뿐인데. 나는 오늘도 머릿속에서 아무에게도 들려주지 않을 노래를 룰루랄라 노래부른다.
내게.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함께. 즐겨. 뭘하든. 너라도.
23일 저녁, 퇴근길에 있었던 이야기다.
사무실 친구놈과 같은 방향이기에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
친구놈은 자리생겼다고 바로 앉아 잠에 들어버리고,
멍하니 지하철 창밖으로 단조롭고, 반복적인 풍경-콘크리트 벽면과 형광등-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슬슬, 편하게 널직히 자리잡고 서있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중간쯤에 어정쩡 서있었고. 어느 역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내 왼쪽까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다. 늘상 있는 일이지 뭐 그런건. 특별하지도 않아.
내 오른쪽 앞자리에 자리가 생겼다. 나는 언제나 그래왔듯 "두다리 튼튼할 때 서서가자" 주의이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고. 그녀는 내 뒤쪽으로 스쳐지나가며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장갑 한켤레를 떨어트렸다. 물론, 보통 사람이라면 장갑을 주워들고 "저기요... 떨어트리셨는데요..."하며 건네면 끝이다. 하지만 재미없잖아?
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떨어진 장갑을, 창밖 풍경 바라볼때와 같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장갑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 왼쪽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그 장갑을 보게 되었고, 장갑을 주워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 이 장갑 누구꺼죠?" 그다지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힐끔 봤더니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상태다. "대화의 심리학"(확실치는 않지만 화술(話術)에 관한 책이었다)의 독서에 열중인 채였다. 누구의 대꾸도 없는 외진 산장속 메아리처럼 공허한 표정으로 중년 아저씨는 반응없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금새 체념하고 장갑을 들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가씨 기준으로는 왼쪽, 왼쪽자리의 위 선반이지. "지하철의 중심에 서서, 장갑을 외치다." 영화 제목같군.
"남이사".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앞에 거슬리는 장갑과, 장갑의 가출을 모르는 그녀의 표정이 측은했다. 뭔가 재밌는걸로. 그녀가 쑥스럽지 않게. 이 두가지를 잠깐 생각해보고 이내 가방에서 펜을 꺼내들었다. 지갑 안에 잠자는 명함(풉. 명함에 내 전화번호가 있었네?)들 중 한마리를 꺼내들고 적었다. "잃어버린 장갑은 왼쪽 선반 위에 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고 싶었지만, 워낙에 내가 악필인데다가 지하철이 덜컹거려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ㅤㅇㅣㅌ억머리 장값흔.."로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테니.
그녀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그 책 위에는 두 손을 포개고 어느새 살포시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들었을까?
나는 강변역에서 내린다. 성내역에서 강변역 사이의 잠실철교 위를 지나며 아까의 그 명함을 그녀의 포개진 손 밑으로 찔러넣었다. 당황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뚫어지게 쳐다 보고 있으면 실례일듯 하여 그녀가 눈을 뜨는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뒤돌아 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은 열렸고, 나는 내렸다.
그녀는 장갑을 찾았을까?
명함의 내 전화번호는(풉..) 보았을까?
장갑이야 찾든말든 무슨상관이랴.
전화가 안오는데 qㅡ ㅛㅡa
사무실 친구놈과 같은 방향이기에 같이 지하철을 타고 가고 있었다.
친구놈은 자리생겼다고 바로 앉아 잠에 들어버리고,
멍하니 지하철 창밖으로 단조롭고, 반복적인 풍경-콘크리트 벽면과 형광등-을 멀뚱멀뚱 보고 있었다. 슬슬, 편하게 널직히 자리잡고 서있으면 사람들의 눈총을 받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나는 사람들에게 밀려 중간쯤에 어정쩡 서있었고. 어느 역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한 20대 후반의 아가씨가 내 왼쪽까지 그 사람들을 비집고 들어왔다. 늘상 있는 일이지 뭐 그런건. 특별하지도 않아.
내 오른쪽 앞자리에 자리가 생겼다. 나는 언제나 그래왔듯 "두다리 튼튼할 때 서서가자" 주의이므로 그다지 신경쓰지 않았고. 그녀는 내 뒤쪽으로 스쳐지나가며 그 자리에 앉았다. 그러면서 장갑 한켤레를 떨어트렸다. 물론, 보통 사람이라면 장갑을 주워들고 "저기요... 떨어트리셨는데요..."하며 건네면 끝이다. 하지만 재미없잖아?
왜인지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떨어진 장갑을, 창밖 풍경 바라볼때와 같이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직 장갑의 존재를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내 왼쪽 앞자리에 앉아있던 중년 아저씨가 일어나면서 그 장갑을 보게 되었고, 장갑을 주워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 이 장갑 누구꺼죠?" 그다지 작은 목소리는 아니었지만, 그녀를 힐끔 봤더니 여전히 눈치채지 못한 상태다. "대화의 심리학"(확실치는 않지만 화술(話術)에 관한 책이었다)의 독서에 열중인 채였다. 누구의 대꾸도 없는 외진 산장속 메아리처럼 공허한 표정으로 중년 아저씨는 반응없는 주위를 둘러보았고, 금새 체념하고 장갑을 들어 선반 위에 올려놓았다. 아가씨 기준으로는 왼쪽, 왼쪽자리의 위 선반이지. "지하철의 중심에 서서, 장갑을 외치다." 영화 제목같군.
"남이사".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지만 자꾸 눈앞에 거슬리는 장갑과, 장갑의 가출을 모르는 그녀의 표정이 측은했다. 뭔가 재밌는걸로. 그녀가 쑥스럽지 않게. 이 두가지를 잠깐 생각해보고 이내 가방에서 펜을 꺼내들었다. 지갑 안에 잠자는 명함(풉. 명함에 내 전화번호가 있었네?)들 중 한마리를 꺼내들고 적었다. "잃어버린 장갑은 왼쪽 선반 위에 있습니다." 깔끔한 글씨체로 쓰고 싶었지만, 워낙에 내가 악필인데다가 지하철이 덜컹거려 어쩔 수 없었다. 그렇다고 "ㅤㅇㅣㅌ억머리 장값흔.."로 보이거나 하지는 않을테니.
그녀는 무릎 위에 책을 올려놓고, 그 책 위에는 두 손을 포개고 어느새 살포시 눈을 감고 있었다. 잠들었을까?
나는 강변역에서 내린다. 성내역에서 강변역 사이의 잠실철교 위를 지나며 아까의 그 명함을 그녀의 포개진 손 밑으로 찔러넣었다. 당황해하는 그녀의 표정을 뚫어지게 쳐다 보고 있으면 실례일듯 하여 그녀가 눈을 뜨는걸 확인하자마자 바로 뒤돌아 문쪽으로 걸어갔다. 그리고 문은 열렸고, 나는 내렸다.
그녀는 장갑을 찾았을까?
명함의 내 전화번호는(풉..) 보았을까?
장갑이야 찾든말든 무슨상관이랴.
전화가 안오는데 qㅡ ㅛㅡa
"나의 낙서장"이라는 커다란 backbone에는 변화가 없다. 그저 누가, 무엇을 얻어갔냐의 차이만이 변했을 뿐이다.
그저 일기장이든, 그저 멋진 포스팅들의 집합소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나의 낙서를 기록해놓을 공간이라는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언젠가(먼 훗날 이야기겠지만) 다시 이 끄적거림을 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러면 된거다. 그러면 내 의지는 성공한것이다.
그저 일기장이든, 그저 멋진 포스팅들의 집합소이든. 그건 중요치 않다.
나의 낙서를 기록해놓을 공간이라는점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언젠가(먼 훗날 이야기겠지만) 다시 이 끄적거림을 보고는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인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아니, 분명 그럴 것이다.
그러면 된거다. 그러면 내 의지는 성공한것이다.
ATG's Music
이분을 처음 알게 된건 철없는 개발자의 넋두리(programmer.mp3) 덕이었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humorous와 씁쓸한 웃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물론,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하지만 왜 이 가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알고 있는걸까..;;
이분을 처음 알게 된건 철없는 개발자의 넋두리(programmer.mp3) 덕이었다.
개발자라면 누구나 humorous와 씁쓸한 웃음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곡이다.
물론,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하지만 왜 이 가사에 나오는 용어들을 다 알고 있는걸까..;;
아직도, 누누네네 누누네노 하는 멜로디가 귓가를 계속 맴돈다.
대체 무슨 노래일까?
알고보니, "그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きみのためなら死ねる)"라는 닌텐도DS의 게임 홈페이지의 BGM.
원곡도 좋지만, 다른 버젼들도 마음에 듭니다.
[ 가사보기 ]
대체 무슨 노래일까?
알고보니, "그대를 위해서라면 죽을 수 있어(きみのためなら死ねる)"라는 닌텐도DS의 게임 홈페이지의 BGM.
원곡도 좋지만, 다른 버젼들도 마음에 듭니다.
[ 가사보기 ]

 사우스 파크 (극장판 무삭제)
사우스 파크 (극장판 무삭제)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걸작선
무라카미 하루키 단편걸작선 댄스 댄스 댄스 1부
댄스 댄스 댄스 1부 인간승리
인간승리